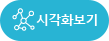| 항목 ID | GC07500017 |
|---|---|
| 한자 | -丁貞烈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
| 집필자 | 서덕민 |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소리꾼 정정렬에 관한 이야기.
정정렬(丁貞烈)[1876-1938]은 일제 강점기 때 ‘국창(國唱)’으로 이름을 떨친 판소리 명창이자 ‘근대 창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전라도 익산군 망성면 내촌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라도 김제군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근대 5명창’[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 사이에 활약하였던 판소리 명창들을 일컫는 말로, 5라는 숫자는 명창을 총괄하는 상징적인 수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섯 명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편제를 계승하고 있으며, 판소리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정렬은 소년 시절 익산에 있는 미륵산의 심곡사에서 소리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인연으로 익산의 심곡사에서는 정정렬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해마다 ‘떡목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인데” 익산 명창 열전]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인데~.” 판소리 단가 「호남가」의 한 대목이다. 근대 최고의 명창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방울(林芳蔚)[1904~1961]이 부른 「호남가」에 함열의 인심을 운운하는 대목이 있는 이유는 함열에 조혜영, 이배원, 김안균 등 만석꾼 집이 셋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인근의 예인들이 몰려와 흥을 돋우는 데에 앞장섰다. 소리꾼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소리꾼들에게 내주는 돈을 ‘소리채’라고 하는데 당시 세 부자의 소리채가 무척 넉넉한 것으로 유명하여 소리꾼들이 익산으로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광주 출신의 임방울 또한 조혜영의 집에서 식객으로 머문 적이 있었다. 임방울은 아침저녁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잔칫날마다 불려가서 소리를 하였다. 세 부자의 인심은 물론이거니와 소리를 아는 함열 사람들이 모여들어 추임새를 넣어 주니, 임방울과 같은 명창이 「호남가」에 함열의 인심을 담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다. 임방울 외에도 박동진(朴東鎭)[1916~2003], 오정숙(吳貞淑)[1935~2008]과 같은 명창이나 신쾌동(申快童)[1910~1977]과 같은 거문고산조의 대가가 익산과 연고를 맺게 된 것도 이들 삼부자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익산 출신의 소리꾼 정정렬은 소리판이 흥성거리던 갑오년[1894년] 이전의 호시절을 『매일신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과거에 급제를 하면 앞에 금의화동을 세우고 긴 행렬을 지어 환향하는 법이었는데 창부들이 금의화동 노릇을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도문잔치를 베풀고 몇 칠씩 잔치를 계속하였음으로 으레 잔치가 계속하는 날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부가 먼 사랑문을 열고 사랑잔치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까닭에 창부의 대접도 상당하였고 잔치가 끝난 뒤에도 사례도 퍽 후하였습니다. …… 봄이면 화동노래 여름이면 풀노래 사정노래 생일잔치 환갑잔치 등에 으레 창부를 청해 노래를 부르게 했음으로 일년 내내 바쁘게 지냈습니다.”
재력 있고 풍류를 아는 세 부잣집이 있고 소리의 맛과 멋을 아는 사람들이 익산 땅에 가득하였으니, 근대를 빛낸 샛별 같은 명창들이 이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거나, 아니면 익산 땅을 잠시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는 게 당연한 노릇이었다. 익산 출신의 명창을 살펴보자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글은 안 읽고 판소리만 하다 쫓겨났다는 조선의 명창 권삼득(權三得)[1771~1841]이 그중에서 제일 윗대라 할 수 있겠다. 권삼득은 안동권씨, 그야말로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소리를 배운다고 고집을 부리다 멍석말이를 당하였던 소리꾼이다. 멍석말이를 당하던 자리에서 “죽기 전에 소리나 한번 하고 죽겠소.” 하고는 좌중의 심금을 울려 풀려났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이렇게 풀려나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익산이라 한다. 지금 권삼득의 무덤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뒷산에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무덤가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익산 여산면에서 태어난 사풍세우(斜風細雨) 신만엽(申萬葉)[?~?]이 있다. 신만엽의 소리가 비껴 부는 바람과 같이 경쾌하고 가늘게 내리는 비와 같이 부드럽다 해서 ‘사풍세우’라 한다. 활동한 시기가 19세기일 것으로 추정되며 언제 나고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신만엽이 창안하였다는 곡조 석화제는 명창들의 소리로 대대손손 전하여 내려온다.
또한, 동편제의 법통을 이어받은 명창 유공렬(劉公烈)[1864~1927], 망성면 내촌리 출생의 국창 정정렬, 여산면 출신 박동진 또한 익산 출신의 소리꾼이다. 오늘날로 보자면 ‘소년 명창’’으로 이름을 얻은 황등면 출신 조통달(趙通達)[1945~ ]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야말로 명창의 도시 익산이 아닐 수 없다.
[“봄바람 다스리는 그대에게 못 미치네” 익산의 명창 정정렬]
익산이 낳은 여러 소리꾼 중 으뜸이라면 정정렬을 꼽을 수 있다. 근대 오명창 중 유일하게 서편제 소리를 계승한 정정렬을 두고 『벽소시고(碧笑詩稿)』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소리 명성 온 나라에 자자해, 예원의 여러 소리꾼들 구름처럼 모였구나. 세간의 날고뛰는 무리라 하더라도, 봄바람 다스리기는 그대에게 못 미치네[年少才名一國聞/ 藝園弟子集如雲/ 世間虎逐龍拿輩/ 管領春風不可及].”
정정렬은 1876년 지금의 망성면 내촌리에서 출생하였다. 정정렬은 어려서부터 소리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정정렬의 부모는 남다른 목청을 가진 아들이 큰 소리꾼이 되리라고 직감하고 국창 정창업(丁昌業)[1847~1889]에게 보냈다. 유명한 소리꾼들이 조기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소리에 입문할 당시 정정렬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조선창극사』를 쓴 정노식은 “정창업은 일족이요, 마침 한마을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정정렬]를 친절하게 교수하다가 별세하였다.”라고 쓰고 있으나, 둘의 관계가 인척이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당대 최고의 명창이었던 정창업이 일족이었는지 여부는 내버려 두더라도 일곱 살 때부터 한마을에서 살며 부모처럼 섬기며 정창업에게 사사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하다.
정정렬이 열네 살이 되었을 때 정창업이 세상을 떴다. 정정렬의 두 번째 스승은 명창 이날치(李捺致)[1820~1892]였다. 이날치 역시 정창업에 버금가는 소리꾼으로서 역시 서편제의 대가였다. 이날치는 특히 「새타령」에 능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명인명창』의 저자 정범태는 이날치가 “뻐꾹새, 쑥국새 소리를 하면 진짜 새가 소리를 따라 날아들어 온 일이 가끔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새도 알아 듣고 날아드는 소리꾼이라면 천하에 몇 안 되는 소리일 터였다. 그러한 스승에게 사사할 기회를 얻었으나 문하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에 이날치 역시 별세하였다. 정정렬의 생애에서 스승운은 별로 없었다.
스승을 잃은 정정렬은 익산의 심곡사에서 홀로 공부하였다. 그 이후로 홍성의 무량사, 공주의 갑사, 영천의 은해사 등을 전전하며 소리 공부를 하였다. 소리꾼이 절에 들어가 수련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으나, 1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치열하게 혼자 공부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정정렬은 쉰 살이 다 되어서 상경하여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과 같은 당대 명창들과 교류하며 판소리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정정렬은 1933년 결성된 조선성악연구회의 주축 인사로 활약하였다. 판소리의 현대화를 위해 「춘향전」과 「심청전」 등을 극장 무대에 올렸다. 판소리는 그저 듣는 것이었지만 이를 극화하여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처럼 정정렬은 소리꾼으로서도 으뜸이었고 판소리를 현대화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만년에 이를수록 기량이 만개한 정정렬은 제자들도 구름같이 몰려 들었다. 특히 김여란, 이기권, 김소희, 김연수, 백점봉, 조상선, 박녹주 등과 같은 명창들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현대 판소리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서편제 계보에서 윗대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계에서는 정정렬이 “「춘향가」의 판을 막았다.”라거나 “정정렬이 나고 「춘향가」가 났다.”라는 말이 전하고 있다. 판을 막았다는 것은 「춘향가」에서만큼은 포정해우(庖丁解牛), 곧 포정[백정]이 소의 뼈와 살을 바르듯 매우 뛰어난 기술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다. 정정렬이 오른 경지는 그의 제자 김연수의 말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정정렬 선생님에게서 3년만 더 공부했더라면 소리의 귀신이 되었을 것을…….”
정정렬은 익산의 심곡사와 인연이 깊다. 몇 년 사이에 두 스승을 잃은 정정렬은 열여섯 나이 때부터 독학을 위해 미륵산 자락에 있는 천년 고찰 심곡사로 들어갔다. 심곡사는 남북국 시대였던 9세기 통일신라의 무염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절로, 규모도 크지 않고 찾는 이도 많지 않았으니 판소리 독공(獨功)[소리꾼이 득음(得音)을 하고자 토굴이나 폭포 앞에서 하는 발성 훈련]을 위하여 그곳만 한 곳이 없었다. 절의 입지 또한 ‘심곡(深谷)’이라는 절 이름에 걸맞게 깊은 골짜기에 안겨 있는 형국이다. 약관도 되지 않은 소년 정정렬은 깊은 산속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하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하였다.
『조선창극사』에서는 정정렬의 목소리를 두고 “천품 성음이 탁하고 성량이 부족하여 공부하던 도중에 자살하려고 하기를 비일비재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처럼 성량이 부족하고 소리가 탁한 것을 두고 소리꾼들은 ‘떡목’이라고 한다. 소리꾼으로서 타고난 것이 부족하였으니 정정렬의 노력이 얼마나 처절하였는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정렬이 만년에 이른 1937년에 인터뷰한 『매일신보』의 내용을 보면 그의 고충이 어떠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예전에도 노래하는 사람이면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씩 산속 절에 들어가 백 일 공부를 하였는데 목소리를 한참 뽑고 나면 배가 뚱뚱히 부어오르고 얼굴과 손발이 붓고 목에서 피를 뱉었습니다. 이렇게 전신이 붓고 목이 말라 부을 때에는 참으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익히고 그대로 목소리를 내뽑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만 기절해 나자빠지면 목이 꽉 잠겨 그 후부터는 노래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 일 동안 목을 가다듬으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게 되여 무슨 중병을 앓고 난 사람같이 됩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소리 하나뿐인데 타고난 목소리는 소나무처럼 구부러지고 등나무처럼 얽히고 막혀서 답답할 노릇이었다. 몸은 아프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소년 정정렬은 절박하였다. 타고난 탁성과 부족한 성량을 갈고 다듬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심곡사에서 보낸 몇 년간의 수행 기간은 소년 정정렬에게 남다른 시간이었다. 소리가 변하여 가는 나이였으므로 고통은 더욱 심하였다. 날마다 정정렬은 절 아래로 내려가 골짜기에 대고 소리를 하였다. ‘해가 저물면 달이 뜨겠지.’ 정정렬은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렸다. 소리는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모두 골짜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목소리가 변하여 가는 소년기의 소리꾼 정정렬이 기울인 노력은 심곡사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몇 년 간의 수행은 그의 소리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어떤 이는 정정렬이 심곡사에서 득음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을 뜨기 얼마 전까지도 독공을 하며 평생을 소리 공부에 매진한 정정렬의 일대기에서 겨우 몇 년의 노력 끝에 득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벽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심곡사였다는 것이다. 익산 사람들은 소리에 대한 정정렬의 열정과 예술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한다. 심곡사에 가면 소년 정정렬이 소리 연습을 하던 곳에 떡목공연장이 있다. 정확한 명칭은 ‘정정렬명창 득음기념 떡목공연장’이다. 익산 사람들은 정정렬을 기리고자 해마다 떡목음악회라는 가을 음악회를 연다.
[“재능이 없어도, 아무리 살기가 갑갑하여도” 정정렬을 기리는 떡목음악회]
심곡사에서 열리는 산상 음악회를 익산 사람들은 ‘떡목음악회’라고 지었다. 말하자면 음치음악회와 다름없는 이름이다. 소리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과 결핍을 뜻하는 말로 이름을 지엇으니 음악회가 기리는 정정렬의 열정과 예술혼은 더욱 빛난다. 떡목음악회는 지난 2012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로 2019년 11월까지 한 해도 빼먹지 않고 떡목음악회는 진행되었다. 해마다 2,000여 명의 관객이 몰리는 가을의 산상 음악회에서 익산 사람들은 정정렬의 불꽃같은 예술혼이 미륵산 자락과 골짜기로 흘러드는 것을 본다. 떡목음악회는 매년 가을 정정렬의 제자 임화영 명창을 비롯한 제자들의 국악 공연은 물론이고 현대식 음악도 함께 어우러져 흥을 더한다. 재능이 없어도, 아무리 살기가 갑갑하여도 노래 한 자락이면 행복해지는, 풍류를 아는 익산 사람들이 모이는 광경을 정정렬이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해가 지면 달이 뜬다네……. 무엇이 걱정인가? 노래하다 보면 이 풍진세상 삶의 모든 시름 잊을 것인데. 아무리 못났대도 아무리 잘났대도 어차피 같은 한평생. 거기 곤드라진 술꾼도, 저기 나물 파는 아짐씨도, 김 진사 댁 종놈도, 아차차 사업 망한 김 사장도, 늙수그레 총각 김씨도 모두모두 이리들 오시게. 걸판지게 한번 놀다 가시구려!”
- 『매일신보』58(경인문화사, 1985)
- 이기우, 최동현 편, 『판소리의 지평』(신아, 1990)
- 정노식, 『조선창극사』(동문선, 1994)
- 정범태, 『명인명창』(깊은샘, 2002)
- 「춘향전을 불러 정정렬」(『매일신보』, 1937. 5. 5.)
-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