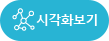| 항목 ID | GC09001318 |
|---|---|
| 한자 | 水利契 |
| 영어공식명칭 | Irrigation Club|Surigye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강성복 |
[정의]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 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민들의 조직.
[개설]
충청남도 부여 지역의 수리계는 수리 시설의 관리를 전담하는 농민 자치 조직이다. 지역에 따라 규모가 매우 다양한데, 물을 받는 구역에 따라 인원은 10명에서 많게는 30~50명이 하나의 수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규모 방죽이나 저수지의 경우 수십 마을이 참여한 수리 조합도 적지 않다.
[역원과 운용]
부여 지역 수리계의 역원은 계장과 수감(水監) 등이 있다. 수리계장은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총책임자이다. 수감은 물의 분배와 물꼬를 담당하는 역원으로, 물감독이라고도 한다. 논에 물을 대거나 수문을 열고 닫는 일, 수세(水稅) 징수 등이 중요한 임무이다. 수세는 물 받는 면적에 따라 집마다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개 수감의 수고료와 수리계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공동 작업]
부여군 각 지역의 수리계는 연간 몇 차례의 공동 작업을 실시한다. 그중에서 주된 작업으로는 수로 정비와 제초 작업이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미리 수리 시설을 보수·점검하는 것으로, ‘보매기’라고 한다. 대개 첫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봄철의 보매기 때에는 수리계 총회를 개최하여 역원의 선출 및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한다. 그런가 하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은 여름철에 장마로 말미암아 토사가 쌓이거나 유실된 수로를 보수하는 것이다.
[현황]
근래에 부여 지역의 대규모 수리 시설 대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되면서 수세를 징수하는 관행은 사라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 조직된 수리계와 수리 조합은 현재 관리 주체가 대개 한국농어촌공사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기존의 부여 지역 수리계들은 통폐합되거나 본연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게다가 논에 농사용 우물을 파는 작업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수리계의 존재는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한 예로 외산면 문신리 구신마을 수리계는 저수지를 축조한 1970년대 초에는 수리 시설로부터 물을 받는 면적이 200마지기[약 13,200㎡] 이상이 되었지만, 1990년대 경지 정리 사업과 수리 시설의 확대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저수지를 이용하는 소작인의 수도 20여 호에서 10여 호로 감소한 상태이다.
[의의]
부여 지역의 수리계는 논농사에 필요한 물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개 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결성된 민간의 자치 조직이다. 따라서 그 운용은 철저하게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리계는 한정된 수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 주는 지혜의 산물이다. 수리계를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끈끈한 연대와 결속을 다진다.
- 강성복, 『부여 문신리 구신마을 샘제와 동화제』(부여문화원, 2011)
- 『한국 생업 기술 사전』 -농업 2(국립민속박물관, 2020)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리계(水利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