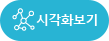| 항목 ID | GC09000419 |
|---|---|
| 한자 | 扶餘縣 |
| 영어공식명칭 | Buyeo-hyeon |
| 이칭/별칭 | 소부리(所夫里),반월(半月),사비(泗泚),여주(餘州)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조선/조선 |
| 집필자 | 엄기석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지역에 있었던 조선 시대 행정 구역.
[관련 기록]
조선 시대 인문 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를 살펴보면 부여현은 옛 백제의 도읍으로 조룡대(釣龍臺)·낙화암(落花巖)·자온대(自溫臺)·고란사(皐蘭寺)와 같은 백제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었다. 『택리지』에서는 부여의 지역적 특징으로 경치가 매우 훌륭하며, 땅이 기름져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다만 도읍으로는 지대가 좁아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나 신라의 도읍인 경주보다는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내용]
부여현의 옛 이름은 소부리(所夫里)이고, 별호로는 반월(半月)·사비(泗泚)·여주(餘州)가 있었다. 지역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쪽으로 공주목·석성현, 남쪽으로 임천군, 서쪽으로 청양현·홍산현, 북쪽으로는 정산현과 인접하였다. 부여현에는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었고, 종9품의 훈도(訓導)가 현감을 보좌하였다. 부여현 내에는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기준으로 현내면(縣內面)·대방면(大方面)·초촌면(草村面)·몽도면(蒙道面)·도성면(道城面)·공동면(公洞面)·방생동면(方生洞面)·가좌동면(加佐洞面)·송원당면(松元堂面)·천을면(淺乙面)의 총 10개 면이 있었고, 각 면 내에는 북포리(北浦里)·신리(新里)·흑천리(黑川里) 등의 동리가 편성되었다.
지역 내 토성으로는 심(沈)·이(李)·서(徐)·전(全)·형(邢)·조(曺)·고(高)·표(表) 등이 있었고, 조선 전기와 후기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역 내 세력 변화 역시 크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리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가문으로 하동 정씨가 있었다. 실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 활동하였던 정인지(鄭麟趾)의 아버지인 정흥인(鄭興仁)이 부여현에 살고 있으므로 정인지가 봉양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정인지가 세조의 노여움을 사서 부여현에 부처되는 등 정인지 가문과 부여현은 관련이 깊었다. 이후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정득열(鄭得說)이 부여 출신이라는 점도 하동 정씨가 지속적으로 부여현에 세력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여현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19세기 중반 자료인 『호서읍지(湖西邑誌)』를 기준으로 우선 토지는 원장부(元帳付) 4,118결에 시기결(時起結)이 2,075결이었다. 호구는 10개 면 호수의 합이 총 2,718호이고 남자는 6,476명, 여자는 6,582명으로 총 1만 3058명이었다. 군현 내 환곡으로는 1864년(고종 1) 기준 합록미(合錄米)가 530여 석, 호조(戶曹) 별비미(別備米)로 1,050석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군역으로는 훈련도감 포수 88명, 군향보 37명, 어영청 정군 53명 등 경안부(京案付) 소속 군역 대상자가 1,314명이었고, 지방 아문의 감영 기패관 1명, 별군 28명, 아병 45명 등 외안부(外案付)에 오른 군역 인원이 741명, 총 2,055명이 있었다.
지역 내 설치된 기관으로는 우선 교통 시설로 이인도(利仁道)에 속한 은산역(恩山驛)·용전역(龍田驛)이 있었고, 원으로는 고성원(古省院)·복천원(福泉院)·금강원(金剛院)이 조선 전기까지 있어서 도로 통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교육 시설로 향교가 설치되었고, 조선 후기인 1695년(숙종 21)에 부산서원(浮山書院)이 세워졌다. 부산서원은 설립된 해에 사액되었다. 이 밖에도 사직단 및 여단, 성황단이 읍치 내 설치되어 지역 내 제사 시설로 기능하였다.
[변천]
부여현은 백제 때 소부리군(所夫里郡)이었으며, 백제 성왕이 도읍으로 삼고 나서는 남부여(南扶餘)라고 하였다. 백제 멸망 이후인 672년(문무왕 12)에는 총관(摠管)을 두었으며, 경덕왕 때 부여군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 연간인 1018년(현종 9)에는 공주에 예속되었고, 1172년(명종 2)에는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 조선 시대 지방 제도를 정비한 1413년(태종 13)부터는 공주목 소속으로 종6품 외관직인 현감(縣監)이 파견되었다. 이후 조선 시대 내내 현을 유지하다가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 과정에서 군으로 변경되었다.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대동지지(大東地志)』
- 『호서읍지(湖西邑誌)』
- 『부여군지』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